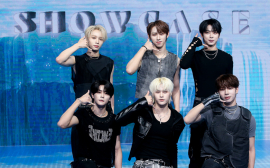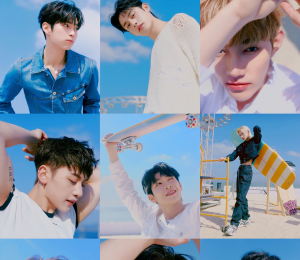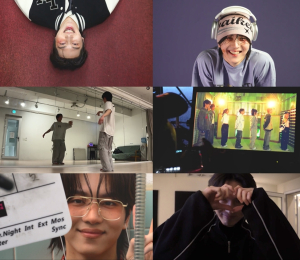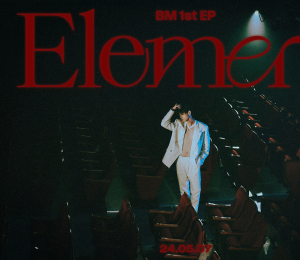[메인뉴스 이예은 기자] 꿈이라는 건,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정체 모를 환상을 심어주며 말 그대로 ‘꿈’같은 이야기로 다가온다. 매번 꾸고, 매번 이야기를 나눠도 늘 새롭다. 여기에 꿈을 스스로 조종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면 얼마나 더없이 매력적인가. 이 매력적인 이야기를 김준성 감독이 팔 벗고 나서,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대중에게 선물하기 위해 왔다.
자각몽이라 알려진 루시드 드림은 꿈을 꾸는 중에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처음부터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애초에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컨트롤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한국 영화에서는 판타지에 가까운 이 소재를 차용한 적이 없다. 영화 ‘루시드 드림’에서는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소재로만 이용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을 관통하는 요소로 썼으며 SF스릴러까지 내세웠기에 그만큼 확장될 국내영화의 다양성을 기대케 했다.
하지만 ‘루시드 드림’은 아주 친절하다. 낯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이해가 어렵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각몽이 없어도 전개가 가능한 수준이며 그만큼 소재의 활용도가 낮고 좁다는 점이다.

대기업 비리 고발 전문 기자 대호(고수 분)는 3년 전 놀이공원에서 아들 민우를 납치당한다. 그는 과거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아들을 찾기 위해 애쓰나 이상하리만큼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루시드 드림을 이용한 수사 기법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고 관련 학문 1인자인 친구 소현(강혜정 분)의 도움으로 꿈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대호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기억들을 되짚으며 진실을 향해 다가간다.
내용이 이렇듯, 영화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달려난다. 이 과정에서 자각몽은 오로지 도구로만 이용된다. 공유몽, 디스맨 등 흥미로운 개념들이 잔뜩 등장하지만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 아들을 찾기 위해 밟는 전개에서도 허점이 속속 드러나 개연성에 아쉬움을 자아낸다.
영화 후반부의 꿈속 세계만큼은 연출에 심혈을 기울인 김준성 감독의 노력이 엿보인다. 황망한 빌딩숲과 무너지는 건물들을 현실의 톤과는 다르게 어두운 톤을 유지하며 영화 속 가장 유려한 비주얼로 손꼽힌다.

고수의 처절한 부성애 연기는 그의 배우 생활의 방점을 찍을 정도로 훌륭하다. 영화의 흐름과 캐릭터의 감정을 따라가기 위해 체중 조절로 만든 그의 비주얼 변화 역시 박수칠 만하다. 더불어, 설경구는 언제나처럼 제 몫을 묵묵히 수행한다. 중반까지 그가 출연했던 다른 작품에 비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극 후반부에서 설경구 본래의 얼굴을 가지고 돌아온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오랜만에 스크린에 모습을 비춘 강혜정이다. ‘루시드 드림’ 속 유일한 여성 배우지만 고수 옆에서 단순히 루시드 드림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인물에 그칠 뿐이다. 물론, 해결에 있어 도움을 주는 인물이긴 하지만 강혜정이라는 배우가 가진 힘에 비해 소모성만 짙다.
대중은 후반작업만 2년이 흐른 ‘루시드 드림’을 긴 시간동안 기다렸고, 김준성 감독과 배우들 역시 하루 빨리 관객을 만나기만을 고대했을 것이다. 그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기대는 커지는 게 당연지사. 그 탓에, ‘루시드 드림’을 향해 바라는 바가 커졌을 테다. 작품의 창작자들도 그 기대에 맞는 부응을 했다면 더 큰 호응을 불러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예은 기자 90090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