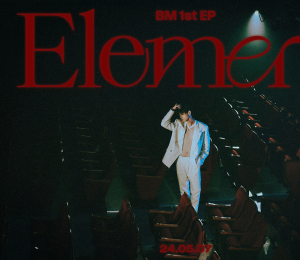[메인뉴스 이예은 기자] 영화 ‘아나키스트’(2000)을 제작 준비 중이던 이준익 감독은 자료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투사 가운데 박열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게 된다. 고등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목도한 후 일본 제국주의에 거세게 투쟁했던 한 청년에게 매료되었고 그의 삶과 가치관을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알리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을 공들인 끝에 이준익은 영화 ‘박열’을 통해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의 신념을 불꽃 마냥 펼쳐냈다. 대신, 극적인 과장과 정형화된 시대극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90% 고증’이라는 자신감 있는 정공법을 택했다.
박열을 향한 이준익 감독의 애정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연신 ‘가네코 후미코’의 자서전을 읊으며 관객들이 이 영화의 본질을 꿰뚫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영혼은 이미 박열에게 오롯이 잠식되어있었다.
▲ ‘소원’부터 ‘사도’ ‘동주’ 그리고 ‘박열’까지, 특별한 수식어 없이 인물의 이름만으로 영화의 타이틀을 선정했다.
“‘황산벌’부터 ‘평양성’ 까지는 이름으로 된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때는, 시대 안에서 인물을 찾은 거예요. 전지적 시점으로 시대 속에 인물을 그려놓았는데 ‘소원’부터는 인물로 시대를 봤어요. 관점이 바뀐 거죠. 저라는 감독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때문에 제목에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일부러 계획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변화 흔적이 드러난 것 같네요.”
▲ 이제훈을 향한 신뢰가 엄청난 것 같았다. 이제훈의 어떤 점에 매료되었나.
“‘박열’은 제훈이만 믿고 갔어요. 관객들은 신예인 최희서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또 현장에서 경력이 가장 많은 배우가 이제훈이었어요. 최희서도 당연히 이제훈만 믿고 갔고 그냥 ‘기승전이제훈’이에요. ‘마음대로 놀아라’ 했어요. 사실 ‘파수꾼’ ‘고지전’ 말고는 이제훈 영화를 본 게 없어요. 드라마도 끊은 지 10년이 넘어서 몰라요. 하지만 그 두 작품에서 이제훈이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긴장과 텐션을 발견했고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박열’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목숨 건 게임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벼워도 안 되고 무거워도 안 돼요. 감정을 너무 터뜨려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거든요. 지르는 연기는 웬만한 배우 다 해요. 하지만 이제훈은 ‘박열’이 진행되는 내내 그걸 물고 있어요. 이제훈의 눈에서는 그게 느껴졌고 딱 박열이었어요.”
▲ ‘동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최희서와 호흡을 맞췄다. 이준익이 바라본 최희서는 어떤 배우인가.
“지성인이에요. 가네코 후미코 후보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미코는 모르는 얼굴이어야 해요. 가네코 후미코는 실존인물이기에 한국의 유명 여배우가 연기하면 관객들은 이입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일본 배우면 좋겠지만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어요.(웃음) 완벽히 네이티브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연기까지 잘 하는 배우는 최희서 뿐이었어요. 그리고 최희서의 실력은 이미 ‘동주’에서부터 100% 검증됐어요. 관객들은 영화라는 결과만 봤지만 우리는 촬영을 거치며 과정을 다 봤으니까요.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릿쿄대학교 교수 3명이 최희서를 보더니 일본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했냐고 물었어요. 한국 배우라고 대답하니 ‘나니?’라며 놀라워하던데요.”
▲ 워낙 찰떡 같이 소화해내서일까. 최희서를 향해 ‘이준익의 뮤즈’라는 평가들이 쏟아진다. 어떻게 생각하나.
“도대체 뮤즈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감을 주고 작품에 나오면 뮤즈인가요? 그러면 저는 정진영, 강하늘, 이제훈 등 뮤즈가 너무 많아요.(웃음) 뮤즈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가두는 일종의 프레임인 거죠.”
▲ 현장에서 별다른 디렉팅 없이 배우들을 자유롭게 풀어놓는다고 하더라.
“어차피 시나리오 안에 있는 대사가 다 감독의 의도잖아요. 그 대사를 치는 순간 그 배우는 극의 흐름에 적절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나리오에 없는 대사 치면 NG를 외치죠. 하지만 어색할 수는 있어도 실력있는 배우들은 그 대사를 의도대로 칠 수밖에 없어요. 디렉션은 이미 캐스팅한 순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면 간섭이고 방해에요. 배우가 몰입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서 날리는 대사를 이래라 저래라 훼방 놓는 거, 저는 안 해요.(웃음) 인사가 만사라잖아요. 감독이 디렉터니까 모든 것에 디렉션을 내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 연이어 시대극을 연출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현대극도 했고 곧 차기작도 현대극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박열이란 인물과 가네코 후미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인간에게서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감독은 영화의 최초의 관객이고, 제가 궁금하면 관객들도 궁금하겠죠. 제가 지루하면 관객들도 지루하고요. 결국 관객인 제가 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