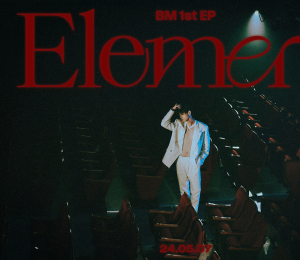[메인뉴스 이소희 기자] 아직 서른 살도 채 되지 않은 누군가가 데뷔 40주년을 맞은 최백호의 노래를 듣고 공감했다면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다. 그의 노래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대 위에 오른 최백호는 멜로디에 따라 가사를 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생을 노래하며 삶의 순간을 되짚었고 세월의 낭만을 붙잡았다. 그래서 20대인 기자는 어렴풋이나마 60대의 최백호가 풀어낸 무대를 이해할 수 있었고 감상에 빠질 수 있었다.
최백호는 지난 11, 12일 이틀간 LG아트센터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 ‘불혹’을 열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약 1100석 중 기자가 가장 나이가 어린 관객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뻘의 관객들이 가득했다.
공연은 배우 이승훈의 독백으로 시작됐다. 한 편의 뮤지컬처럼 연출된 오프닝에서 이승훈은 백발의 노인으로 변신해 관객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젊은 시절과 나이가 든 지금을 이야기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최백호의 40년이었다.
최백호가 활동한 햇수만큼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오프닝 연출을 보자마자 공연에 몰입할 수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관객들은 이승훈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식의 입장에서 이승훈을 바라보았을 터다. ‘아, 부모님이 저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내가 커서 부모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싶자 마음 한 켠이 찡해지기 시작했다

공연장에는 최백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했다. 게스트로 초대된 주현미는 데뷔 당시 최백호와 무서웠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지금 이렇게 함께 무대에 서 있는 시간에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최백호는 공연 중간 중간 자신의 노래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들려줬다. 그것은 곧 그의 인생에 기록된 하나의 순간이었다. ‘마르따의 연인’은 당초 다른 가수가 부르려 했던 곡이나,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이 부르게 됐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다.
최근에 에코브릿지와 발표한 ‘부산에 가면’과 ‘바다 끝’도 불렀다. 브릿지 영상 속 최백호는 ‘부산에 가면’에 대해 “제3의 전성기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젊은 아티스트와 소통하며 음악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그에게 펼쳐질 미래였다.
자신이 가수로 데뷔할 수 있게 만들어준 노래도 털어놨다. 40년 전 최백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그 심경을 글로 기록했다.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다. 당시 최백호는 죽음에 대한 무서움보다 ‘죽어서 어디로 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과연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단다. 종교는 없지만 천당과 지옥을 발견했고, 그곳은 바로 땅 끝도 우주 너머도 아닌 자식이었다. 최백호는 “죽어서 자식의 몸으로 간다”고 말했다. 자식이 행복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불행하면 지옥이라는 말이다.

그는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외롭고 쓸쓸한 목소리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열창했다. 반주 없이 어렴풋이 소리를 내던 찰나에는 어머니를 잃었던 최백호의 순간으로 회귀했고, 그 절절한 마음은 몰입으로 다가왔다.
약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최백호는 가슴을 내리치는 목소리로 파고들었다. 훌륭한 테크닉보다 진실한 마음은 관객을 울렸다. 그가 내뱉는 음 하나하나, 그리고 울려 퍼지는 진동은 겹겹이 쌓인 세월의 무게가 덧입혀져 묵직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최백호의 노래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고 말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앞자리에 앉았던 중년의 남성 관객들은 최백호가 노래를 마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박수를 쳤다.
왜 유독 최백호의 노래가 남다르게 다가올까. 그가 전하는 감동은 나이와 성별 상관이 없었다. 사랑만이 아닌, 자신이 거쳐 온 삶 자체를 노래로 승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도 때로는 한 사람으로서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다.
앙코르 첫 곡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준 ‘낭만에 대하여’였다. 최백호는 “나이를 먹는 게 싫지는 않다. 나는 내 나이가 좋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의 세월과 낭만이 있다. 최백호는 가장 진중하고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지닌 두께에 공감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 응축된 시간을 받아들이게 해줬다.
이소희 기자 lshsh324@naver.com